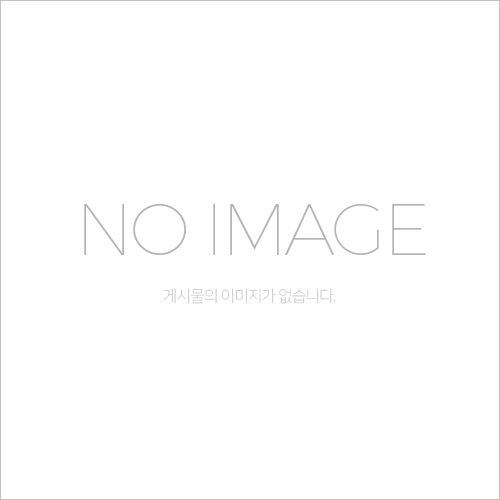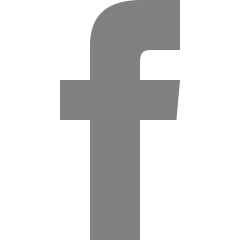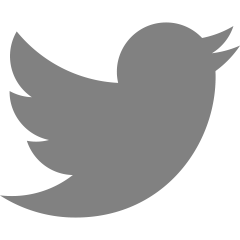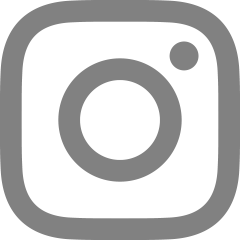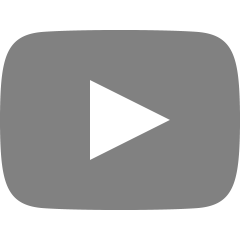한국미술사 - 석탑의 발전 7c 전반의 이야기
한국 미술사
석탑의 발전
7c 전반의 이야기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삼국시대에는 주로 나무를 사용한 목탑이 탑의 주를 이루기도 했다. 허나 나무라는 소재는 '불' 즉, 화재와 '해충' 그리고 습도 등 많은 자연적인 약점이 존재하는 소재였다. 한편 이 탑이라는 것은 불교가 생성된 인도에서 부터 석가모니의 사리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서 발전해왔는데 이렇게 영구히 보존되기 어려운 소재로 제작되었을때는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나무와 비교해 그 특성이 단단하며 불, 벌레, 습기에도 강한 소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석'탑이다. 이에 따라 석탑의 발생이유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영원히 지키고자함을 알 수 있다.
7c 전반의 이야기
7c 전반의 석탑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먼저 두가지 양식을 설명해야 한다. 이 두가지 양식은 조적식과 결구식이라는 것인데 먼저 조적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적식은 돌을 사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용어의 한자를 풀이해보자면 組(짤 조) 積 (쌓을 적) 式 (법 식) 이 되는데 이것은 곧 조직하여 쌓아올린다는 뜻이다. 즉 큰 돌을 가지고 벽돌과 같이 켜켜히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적식은 돌이 가지는 물질성 이를 괴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를 극대화하기에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돌로 쌓아 만들기가 쉽다는 특징도 지닌다. 가장 대표적인 조적식 석탑은 바로 그 유명한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 634년, 현재 높이 9.3m, 국보 30호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적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모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한다. 모전은 '벽돌 처럼' 만들었다는 뜻으로 분황사 모전 석탑을 보면 마치 벽돌을 쌓아올린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그 처럼 보이게 돌의 표면을 깎아서 만든 것이다. 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거대하게 탑파를 제작했던 인도의 특징을 가져오면서도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전탑(벽돌로 쌓아서 올린)의 형식을 보여준다. 1층 탑신부의 감실 입구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인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결구식은 목탑이 석탑으로 발전하였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분 부분으로 짜여진 건축물인 목탑처럼 돌을 하나 하나 다듬어 부분을 결합해 쌓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탑이 석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결구식 석탑은 백제 시대 미륵사지 석탑을 예로 들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 백제, 639년, 현재 높이 14.2m,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가양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결구식 석탑이다. 여기서 목탑이 석탑으로 변하는 과정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고 목탑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1층 탑신부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들어 갈 수 있게 제작되었고 내부 중앙에는 심주가 있다. 1층 한 면에는 네개의 기둥이 있어서 이 건물이 3칸짜리 건물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이 기둥은 민흘림 기둥으로 제작이 되는데 민흘림, 배흘림과 같은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목조건축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 평방을 본뜬 모양을 설치한것도 보인다.
자 이제 다음으로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 석탑의 발전으로 이행하는 대표적인 석탑을 한 번 알아보겠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중층, 백제 6~7c, 충남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보다도 한층 발전된 백제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기단부가 낮게 설정되었으며 1층 탑신이 높게 설정되어 2층부터 탑신의 높이, 너비를 줄여 1층에 시선이 머무르게끔 하였다. 1층 탑신을 보면 미륵사지와 다르게 3칸 건물이 아닌 1칸 건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목조 건축 양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석탑 양식으로 정착되는 큰 구조적인 특징이다. 이후 모든석탑에서는 이런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통일 신라시대에서 전형양식이 된다.
이렇게 7c 전반의 이야기를 해보았다. 석탑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서 더 꽃을 피우게 되며 한층 더 발전되는 양식을 보여주게 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통일 신라 시대의 석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