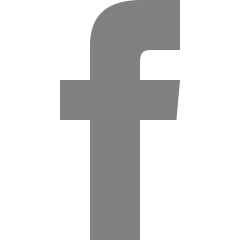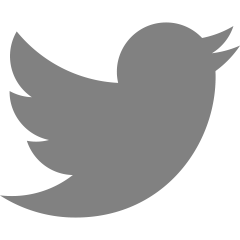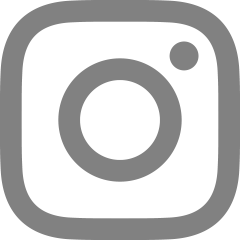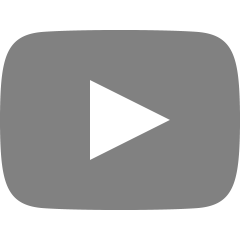TXT/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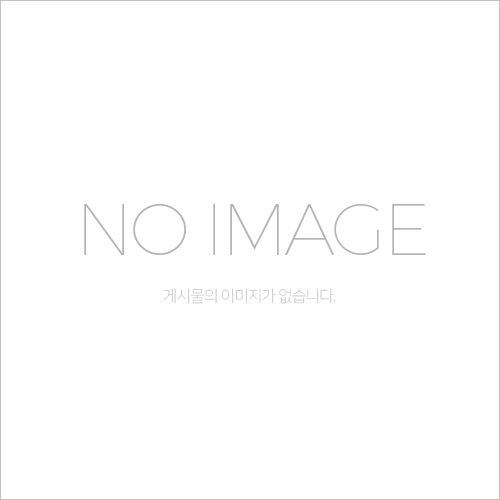
기념비 조각의 낭떠러지 2015년 한국에서는 두 가지 ‘기념비 조각’이 제작되었다. 하나는 세계인과 공유된 경험을 상징하는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단국가의 특수상황이 자아낸 비극을 상징하는 ‘발’이었다. 두 기념물은 각각 희극과 비극의 사건을 기록하는 구체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기념비 조각’은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위계적 권력을 정당화 하는데 기여했다. 제작주체들은 ‘기념비 조각’에 담긴 의미를 예술로서 정당화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의 낭떠러지로 밀려난다. 이 글에서 나는 두 ‘기념비 조각’들이 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혹자는 기념물의 목적에만 의거해 이 비판이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일축할 수 있다. 노파심에 말하자면 ‘기념비 조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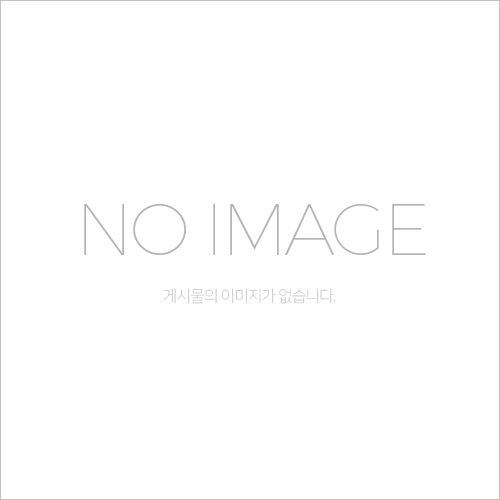
이미지 공유지로서의 신생공간 ‘노드’ 혹은 ‘대안공간 2.0’ 나는 ‘파생공간n 젊은이들의 염원’이라는 글을 통해 신생공간을 ‘파생공간’으로 정의하고자했다. 당시의 나는 기존 제도권 밖(안?)에 생겨난 신생 미술계를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맥락화하려고 시도했다. 이어서 이들의 세부적인 역학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들의 활동영역은 인터넷 체계의 모습과 닮아있다. 내 SNS의 타임라인에는 전시 소식들이 넘쳐난다. 특히나 ‘신생공간’의 전시와 행사가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기존 매체에서 홍보되기 어려운 자생적 기획 자체가 ‘웹’ 시스템에 적응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을 설명해볼 수 있을테다. 이 글은 ‘데이비드 조슬릿’이 ‘라운드 테이블’에 기고한 ‘개념미술2.0’에서 사용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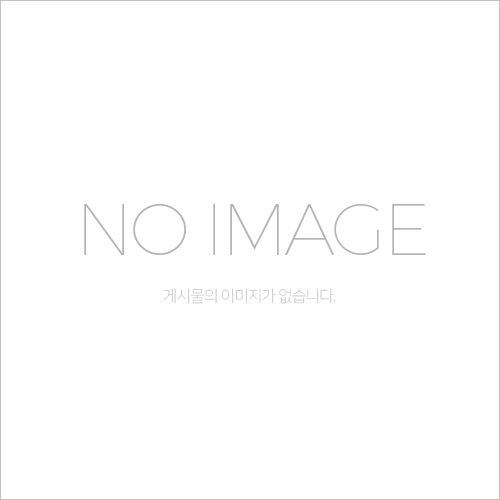
n 젊은이들의 염원n The desire of young people 미술계는 계속해서 굴러간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자리는 유보되고, 시립미술관은 지드래곤과의 혐업전시로 많은 이야기들(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만들어내고, 유수의 갤러리와 미술관에서는 기획적, 개인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은 미술잡지나 미술정보웹사이트에 의해 전달된다. 그런데 이런 메인스트림 밖에 어떤 ‘염원’들이 꿈틀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생공간’이다. 신생공간 중 하나인 ‘교역소’에서 이루어진 과 과 같은 행사에서 신생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젊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자신들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 공간들과 사람들은 서울시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다. 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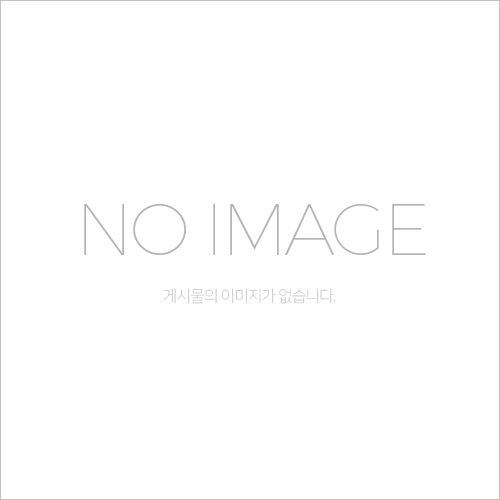
1. 이 시리즈의 사진 대부분은 이주민 결혼을 한 여성들이 중심이다. 국제결혼이 흔해져가는 이 시내에 이 작가가 주목하는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또 사건에 쉽게 연루되는 인종으로 낙인찍혀 있다. 사만과 그녀의 가족들, Saman and his family, 30×45cm, inkjet print, 2013 2. 사진에서 그녀들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말해주는 요소는 그녀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남편과 그녀 자신들의 유전적 혼합을 의미하면서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녀들의매개자 (한국인과 그 자신의) 가 된다. 성남 중앙 시장, 50×75cm, Seongnam Central Market, inkjet print, 2013 3. 사진속 피사체이자 사진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