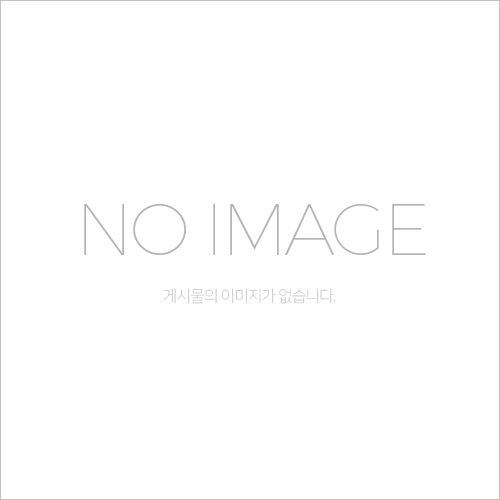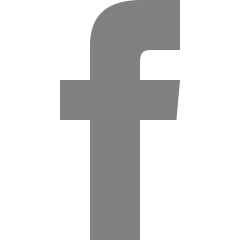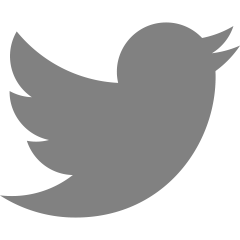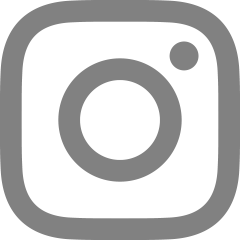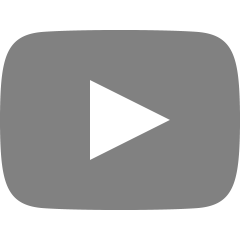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읽는 중..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읽는 중
미적 모더니티는 속물 근성으로 표상된 근대 사회의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체계들을 만들어 왔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미적 모더니티와 사회의 모더니티는 서로 붕괴되어 섞여버린거 같다. 일정한 협약 혹은 합의 없이 섞인 '카오스'상태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는 모든 가치가 인정받는 다원주의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다원주의의 장점과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 정초의 단계에서 가려진 단점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역시나 너무 급진적인 그러나 혁명은 없었던 해체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 같다. 이를 잘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게 아닐까?
한국은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비록 모더니티 자체는 그 종교적 기저를 감추고 지우려했지만) 모더니티의 가치관을 흡수하려 했지만 결과는 기형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인 지금 한국의 모더니티(시대의 가치관으로서의 모더니티)는 유럽에서 처음 생성되어 미적 모더니티와 사회적 모더니티가 형성한 대립각의 모양새를 보여주는게 아닐까?
사회적 의식은 미술을 너무나 고귀한 문화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근대의 사회적 가치인 속물근성은 예술을 부정적인 잉여생산(미술을 언제나 잉여가치의 생산을 도맡았지만)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대중은 언제나 쉽고 즉각적인 형태만을 원한다고 취급되어버린다. 테리 스미스가 그의 저서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에서 말한 퇴행성-선정주의, 리모더니즘, 스펙타클주의 미술들은 무의미를 의미로 삼거나 의미의 과도화를 통해 한눈에 독해하는 것을 불가하게 하고, 예전의 의미를 각색해서 내놓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익숙하게 알게된 것을 따라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리모더니즘의 경향이 성공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