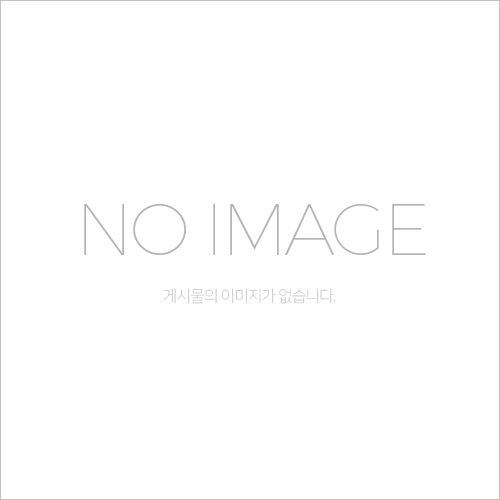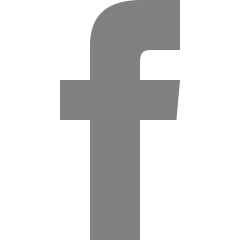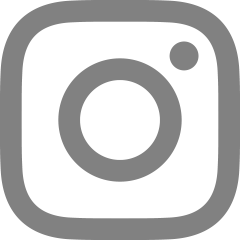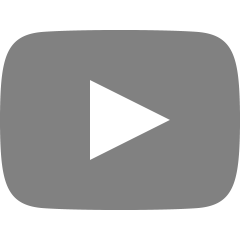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노기훈' [1호선], '김진선' [2호선 부루마블] Review
‘문장’과 ‘놀이’
이미지를 엮는 두 방식
‘노기훈’- <1호선>
‘김진선’ -<2호선 부루마블>
우리의 도시는 수 없이 많은 ‘이동’이 일어나는 장소다.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차들, 레일 위를 지나는 전철들, 하늘을 떠 다니는 비행기 등 이런 교통수단은 점점 인간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활동반경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이 중에서 전철 혹은 철도는 운행시간과 경로가 정해져있다. 전철에서는 수 많은 인간군상들을 관찰 할 수 있다. 어쩌면 모두가 그냥 한 ‘인간’으로 치환되는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철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전철은 많은 인간들의 ‘삶’이 복잡하게 뭍어있어서 흥미롭기도 하다. 그래서 일까 우연히 1호선과 2호선을 소재로한 두 개인전이 있었다. 한 명은 <1호선>이라는 전시제목으로 전시한 ‘노기훈’ 작가고, 다른 한 명은 <2호선 부루마블>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한 ‘김진선’ 작가다. 처음엔 두 전시를 모두 보고나서 각 작가의 시선이 매우 다르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두 시선이 완전히 다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이 글의 시작점이었다.
1호선이라는 문장
<1호선>전시의 작업을 ‘노기훈’ 작가 본인은 이렇게 정의한다. “<1호선>은 한강철교가 준공되기 전인 1899년 당시 경인선을 따라 인천과 노량진 사이에 있는 26개 역을 걸어 다니며 철로 곁을 떠다니는 인간 군상과 일상 그리고 풍경을 촬영한 사진 도큐먼트다.” 작가가 주목하는 지점은 ‘1호선’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다.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처음으로 ‘증기기관차’가 달린 경인선은 식민지 지배와 우리의 근대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경인선은 1974년 전철화 사업에 힘입어 지하철 1호선이 되었고, 서울-인천을 이어놓는 도시 교통 수단이 되었다. 또한 1호선은 현재 더 확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처음 <1호선>이라는 전시 제목을 알게되었을때 나는 인천행이 아닌 수원, 신창행 1호선을 먼저 생각하게되었다. 2013년부터 작가는 인천에서 거주하기시작했다. 이 것이 ‘1호선’을 대하는 시선을 결정한것이 아닐까?
- 노기훈_온수-오류동 폴라로이드_피그먼트 프린트_100×125cm_2013
전시에서 사진 배열 순서는 뒤죽박죽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사진을 전철역 순서대로 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것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촬영한 사진은 직접적으로 ‘1호선’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 같다. 전시의 작업들은 정갈하고 다듬어진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딘가 음울한 사진이다. 전철역의 풍경 혹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넌지시 지시되지만 전체 맥락은 ‘1호선’을 떠올리게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 전시의 맥락을 지우고 각 사진을 따로 본다면 의미는 전혀 달라질것이다. 이 전시의 사진들은 철로 위에서 낚아낸 것이고, 그것말고는 연관이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시의 사진들은 직접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진들에 걸린 하나의 문장을 통해 관람자가 의미를 읽어내도록 유도한다. 이미지 자체는 선명할지 모르지만 각각의 의미는 뿌옇다.
- 노기훈_영등포-신길 노점_피그먼트프린트_80×100cm_2013
‘노기훈’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지하철 1호선은 노량진역에서 인천역까지 지하로도 터널로도 지나가지 않아 날씨가 변하는 대로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객차를 점유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비춘다. 차창 밖 풍경 역시 열차 속도에 맞춰 빠르게 사라지며 매혹적인 추상화로 변신한다.”라고 쓰고있다.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추상화’로 변하는 풍경을 작가는 포착하고싶었던게 아닐까? 우리가 각각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A역과 B역 사이에 있는 ‘무엇’을 찍었다는 것이다. 유난히 바닥에 떨어진 잎, 정신없이 먹은 식사, 창 밖에 보이는 천편일륜적인 기하학 덩어리, 온갖 전단지가 바닥에 정신없이 떨어진 풍경, 아이들의 모습, 노 부부의 모습 등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은 경인선 1호선 전철에 엮인 풍경들이다.
- 노기훈_도화-주안 커플_피크먼트 프린트_100×125cm_2015
하나의 맥락을 통해 사진들을 엮는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작업의 화면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현재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생활을 통해 배어나오는 과거 시간의 축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가가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근대 문물은 풍경을 낳았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쓸모를 달리하면서, 지금도 21세기 초반이라는 시간 배경 아래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 중이다.”라고 생각한 점은 작업에서 잘 드러난다. 작가는 지금은 ‘1호선’으로 개명된 ‘경인선’의 26개 역의 축적된 과거를 현재의 이미지를 통해 회귀하도록 한다. 이 회귀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작가는 1호선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자기의 시선의 눈높이를 맞추어 과거를 되돌아오게 한다.
2호선이라는 놀이
‘김진선’ 작가의 <2호선 부루마블>를 보며 가장 먼저 생각해볼점은 ‘2호선’ 노선이 ‘순환선’이라는 점이다. 계속해서 돌고도는 그 전철은 ‘노기훈’작가의 1호선 사진 처럼 달라지는 지역 풍경의 차이를 보여줄 수 없다. ‘2호선’은 오로지 서울 안에서 빙빙 돌고있다. 서울은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작가의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신나는 놀이와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전시에서 <윌리가 찾아라>와 <Green Picker>라는 두 프로젝트 작업을 볼 수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2호선’을 순환하며 이루어졌다. ‘순환선’은 작가에게 ‘부루마블’지도로 인식되어 거대한 싱글 게임의 무대가 되었다.
- 김진선_월리가 찾아라 start 방배역_종이에 드로잉_29×21cm_2016_부분
<윌리가 찾아라>는 방배역부터 서초역까지 ‘외선순환’하는 2호선 역 43개를 전부 내리면서 작업되었다. 전시장에는 43개의 종이가 걸려있었다. 작업의 목적은 바로 ‘녹색’을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이다. 시작에 앞서 ‘김진선’작가는 녹색 줄무늬 옷을 입었다. 이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윌리를 찾아라’의 오마주인데 그 ‘윌리’는 빨간 줄무늬옷을 입고있다. 어쨌든 작가는 ‘2호선’을 상징하는 녹색을 입거나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역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윌리가 찾아라>는 얼핏 그림일기 처럼 보인다. ‘그림, 역 정보, 시간, 메모’가 기본적으로 기입되었고, 발견된 녹색의 좌표값, 재치있는 별점(역 마다 다르다.)도 기입되어있다. <윌리가 찾아라>는 단순한 일러스트작업이 아닌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정보가 뒤섞인 ‘놀이’다. 윌리라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타자를 찾아나서는 이 작업은 RPG게임의 세이브 파일들로 보인다.
- 김진선_월리가 찾아라 start 방배역_종이에 드로잉_29×21cm_2016_부분
<윌리가 찾아라>는 단순한 기록 혹은 녹색 찾기 게임인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래의 목적과 달리 놀이의 과정에서 작가는 전철역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별함’을 인식하게 된다.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서 기록된 풍경을 보면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작가는 메모에서 지친 프로젝트에 활력이 생겼다고 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것을 볼 수 있다. 타자에게 특별함의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시선’에 의해 가능해진다. 바로 ‘녹색’을 찾는 시선말이다. 무엇보다 좌표화된 녹색은 모든 개인이 전부 다르다는점을 보여준다. 색의 좌표는 곧 한 사람의 삶의 좌표다.
- 김진선_월리가 찾아라 start 방배역_종이에 드로잉_29×21cm_2016 설치 전경
지하철을 보는 방식
1호선의 문장과 2호선의 놀이는 실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른 방식들을 보여주었다. ‘노기훈’ 작가의 ‘스트레이트 포토’는 직접 이미지를 포착한다. 동시에 하나의 의미에 묶여있다. 반면 ‘김진선’작가의 <윌리가 찾아라>는 자신의 목적이 수행된 순간을 다양한 기록으로 직조한다. 이미지는 그림과 글, 정보에 의해 다양하게 엮여 나타난다. 그러나 주목적인 녹색을 찾는 놀이보다 부산물인 각 전철역 풍경 속 인물들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김진선'작가의 작업 속 이미지는 정확히 하나의 순간을 지시한다. ‘노기훈’ 작가의 <1호선> 사진 작업들은 ‘역사성’이 강하게 남아있고, 과거의 모습들이 파편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다. 반면 ‘김진선’ 작가의 <2호선 부루마블> 속의 순환은 반복된 순간들로 하여금 현재의 시간을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작가의 시선은 ‘현재’에 강하게 꽂혀있다.
‘노기훈’작가의 시선은 전철이나 전철역이 아닌 그 밖의 풍경으로 향해있다. ‘김진선’작가는 아주 확실하게 전철역을 바라보고있다. 두 작가의 시선차이는 각 노선이 가지는 위치때문에 달라진다. ‘노기훈’작가가 찍는 1호선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1899년 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첫 모습이다. 그것은 경인선이고 무엇보다 ‘노기훈’작가는 서울의 반대편으로서 ‘인천’을 보고있다. 서울이라는 테두리 변방을 촬영하기 위해 작가는 그 장소들의 ‘주변’을 포착한다. 따라서 ‘노기훈’작가의 사진에는 ‘변방’을 보는 작가의 시선이 두겹으로 둘러져있다. 순환선 2호선을 바라보는 ‘김진선’작가의 시선은 앞서 말했듯이 ‘현재’에 머물러있고, 이 ‘현재’를 인식하기 위해 작가는 복제된 것 처럼 유사한 전철역 안의 모습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구분한다. ‘과거’와 ‘현재’, ‘밖’과 ‘안’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단순한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재 자체가 가지고있는 특성에 의해 두드러지고있다.
‘노기훈’작가와 ‘김진선’작가의 전철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때문에 다른지 궁금했다. 두 작가의 작업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은 각 전철 노선이 가지는 ‘특성’이 ‘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을 통해 드러난 1호선의 을씨년스러운 이미지와 2호선의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각각이 가지는 절대적인 특성은 아니다. 따라서 '특성'과 '시선'은 서로 복잡하게 섞여들어가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노기훈’작가의 사진은 ‘식민지배’와 ‘근대화’이후 이어진 지금까지의 축적된 퇴적층의 단면을 ‘오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김진선’ 작가의 <윌리가 찾아라>는 작가 자신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적 장소를 조금 특별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익숙한 도시를 낯설게 바라보는 나그네가 될 수 있었다.’라고 작업노트에 쓰듯이 강한 주관적 시선이 개별 기록 용지에 서려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작업의 이미지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분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작가의 작업 모두 엮여있었기 때문이다. ‘노기훈’ 작가는 사진들을 아예 문장으로 만들고, ‘김진선’ 작가는 하나의 놀이에 각각의 중요한 현재성을 각인했다. ‘문장’과 ‘놀이’는 이미지를 엮는 방식이다. 전시는 하나로 엮인 그 이미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by. 하마
사진출처
노기훈 - 네오룩(https://neolook.com/archives/20160318h)
김진선 - 직접촬영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니모자 - 평범한 폭력 [Review] (0) | 2016.05.16 |
|---|---|
| 정희민 - 어제의 파랑 [Review] (0) | 2016.04.15 |
| 박정원 <슬픈몸> - 플레이스막 [Review] (0) | 2016.03.24 |
| 김희천 - 랠리 [Review] (0) | 2016.02.22 |
| 박광수 - 검은바람, 모닥불 그리고 북소리 [Review] (1) | 201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