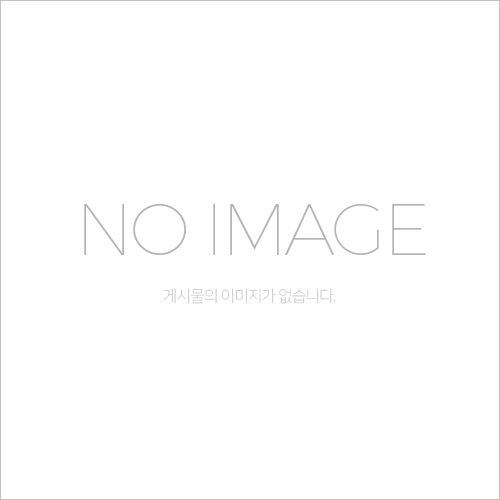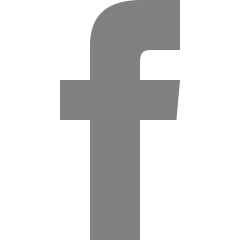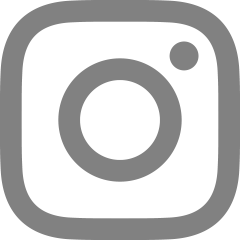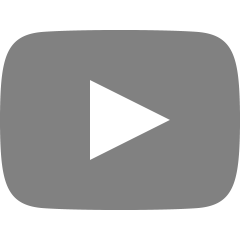홍철기_맹지/유리와_조경사진 [Review]
홍철기
맹지 No man’s Land
합정지구
6.19-7.12
유리와
조경사진
사진위주 류가헌
8.18-8.30
도시식물에 교차되는 두 개의 시선이 벗겨내는 ‘욕망’
사진을 비롯한 미술 매체에선 많은 경우 공통적인 주제나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 두 작가의 시선도 공통적인 대상으로 향한다. 우연찮게 2개월 차이로 두고 ‘홍철기’작가와 ‘유리와’작가는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두 작가가 촬영한 대상은 도심 속 식물이었다. 얼핏 두 작가의 사진은 같은 작가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같은 대상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교집합이면서도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그들의 사진은 조경된 식물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게 한다. 조경이라는 행위는 도시 속에 자연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공원같이 미관을 극대화 하는 장소의 조경은 일정정도의 아름다움(진짜 아름다움인지 의문을 품게 하지만)을 가지는 반면 두 작가가 촬영한 도시 속에 낑겨있는, 부산물처럼 도태되어있는 식물들은 아름다움보다는 기이함을 자아낸다. 이 기이함은 인간의 욕망때문에 드러난다. 나는 오늘 이 글에서 조경활동이 내포하는 인간의 욕망을 두 작가의 사진 속 시선을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두 작가는 각각 다른 이유로 도시 식물을 촬영하게 되었다. ‘홍철기’작가는 선배의 작업실에서 처음 가로수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나무껍데기의 질감에서 본인의 과거, 현재를 잇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 후 길을 가던 중 주위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소나무를 발견했고 작가 자신과 동일시 했다. 그는 도심 속 식물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했고 ‘맹지 No man’s Land’라는 곳에 자신이 위치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맹지는 “내가 서있는 공간은 길이 있어도 없는 공간”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경계가 없는, 경계 사이에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다. 그는 앞으로 향하지 못하지만 살아있기에 몸부림치는 식물들과 선택과 판단을 미루는 자신을 동일시 한다. 그가 촬영한 사진들 속에서 풍기는 초록으로 가득하지만 텅빈느낌도 여기서 기인하는 듯 하다.
‘홍철기’ 작가가 선배의 사진에서 부터 시작해 가로수를 통해 자기 위치를 측정해보고 그 결과 ‘맹지’로 결과를 내린 것과 달리 ‘유리와’작가는 조금 더 직접적인 과정을 겪는다. 작가는 친구 집에 놀러가면서 건물 사이에 껴있는 나무들을 발견한다. 건물 사이가 넓지 않고 공간들도 빡빡하지만 그 곳에는 나무들이 꼭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이후에 건물 사이의 나무들에 대해 생각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것의 존재는 도시인들에게 당연했던것이다. 작가는 익숙한 그 나무들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당연시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한다. 작가는 건물 속에 끼어있는 나무들 처럼 특별히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추적한다.
‘홍철기’작가는 자기의 현재 위치를 도심 속 나무들을 통해 발견했다. 그리고 ‘유리와’작가는 당연시되는 보통의 것으로 나무를 대하며 그 나무들을 ‘현대인’과 등가의 관계에 놓는다. 둘의 시선은 ‘내부로의 집중’와 ‘외부로의 확산’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촬영 계기로만 말하기는 부족하기에 작업을 통해서 그 시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말해야 한다. 두 작가 모두 도시 속 식물을 촬영하지만 집중하는 점은 극명하다. ‘홍철기’ 작가가 나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경되는 상황과 공간, 행위, 형태에 집중한다면 ‘유리와’작가는 건물 사이에 낑겨있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풍경에 집중한다. 재밌게도 ‘홍철기’ 작가가 내부로 집중된 시선을 나무와 그 주변 풍경의 전체적인 상황 에서 찾아내는 반면 ‘유리와’ 작가는 외부로 확산되는 시선을 건물과 관계맺는 나무의 한정적인 상황에서 찾아낸다.
초록(1), pigment print, 100x150cm, 2014
<초록(1)> 작업은 전봇대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을 식물들이 압도적으로 침범하는 풍경이다. 전봇대의 기계적인 부분들은 기이할 정도로 증식된 나뭇잎에 의해 제 기능을 못할 것 처럼 보인다. <초록(3)>은 가지치기 중인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록(1)>과 달리 자신의 잎을 모두 잃어버린 나무는 처량해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증식된 모습과 마찬가지로 기이하다. <간천>이나 <주차장>, <조경(1)> 작업은 주변 상황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나치던 조경식물의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다. ‘홍철기’ 작가의 프레임안의 나무들은 처량하고, 기이하면서 때론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미 없는 형태를 보여준다. 푸르른 녹지보다는 죽어있는 습지처럼 보인다.
<초록(3)>, digital pigment print 75x50cm, 2011
다른 사진과 달리 <조경(3)>은 조각적 형태를 보이도록 촬영되었다. 조각 작품처럼 기하학적인 밑받침을 가진 가로수는 전형적인 스페이드 모양으로 깎여 있다. 그것은 길가의 풍경형성에 이바지한다. 동시에 바닥과 밑받침의 타일은 그 위에 얹어진 가로수와 달리 생명력이 없어보인다. 작가가 촬영한 나무는 더 이상 초록의 생명이기 보다는 딱딱한 조각품 혹은 레고의 나무 형태같다. 생명이 소실되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은 작가가 자각하는 자기의 위치 ‘맹지’에 존재할 식물이다. 그 식물들은 방향성 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소진할때까지 증식하고 잘리고를 반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성은 이미 비어보이는 것이다. 나무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나무의 생명력은 이미 소진되어있다. 나는 작가가 이런 비어있는 생명성을 포착한 점이 흥미롭다.
조경(3), digital pigment print, 60×45cm 2015
레고 나무
생명력을 이미 소진해버린듯 보이는 ‘홍철기’ 작가의 식물과 달리 ‘유리와’ 작가의 작업안에 보이는 나무들은 ‘필사적’이다. 우리가 주택단지나 빌라촌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면서 보는 ‘나무’들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보다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유리와’작가는 그 ‘나무’와 ‘인간’을 등가시킨다. 예컨데 ‘나무’옆을 걷는 ‘나’도 결국 현대사회의 주변물인 것은 동일하다. <조경사진>1시리즈는 건물 사이, 뒤, 옆에 낑겨있는 나무들을 촬영한 작업이다. <조경사진>(1)은 건물 사이 골목에 있는 두 개의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낡아있지만 여전히 견고해보이는 건물의 외곽과 비교하면 두 나무는 처량하게도 얇아보인다. 나무 자체의 생명력은 그다지 강해보이지 않지만 강건한 것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하는 처량한 삶을 떠올리게 한다.
조경사진(1), digital pigment print, 112x139cm, 2010
<조경사진>(2)은 역시나 건물 사이에 있는 나무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건물을 먹어치우는 듯 하다. 나무는 골목을 비집고 나와서 자신의 발기된 형상을 드러낸다. 압도적인 형태나 처량한 형태나 모두 필사적인 모습인것은 분명하다. <조경사진>(3)은 ‘홍철기’작가의 <초록(3)>처럼 잎을 잃고 잘려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조경사진>(3)의 나무는 다시 잎이 나지 않을 것 처럼 전설들에 꽁꽁 묶여있다. 사회의 억압적인 엮임, 묶임 처럼 그 나무는 제어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역할을 통해서라도 꿋꿋이 서있으려 한다. 이 사진은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억압되어있는 필사적 삶을 가시화한다.
조경사진(2), Digital pigment print, 112x139cm, 2012
비어있는 생명성과 필사적인 삶을 보는 두 작가의 시선에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기이함’이다. 서론에서 ‘기이함’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서술했다. 도심, 주거지 속 인간들의 기하학적이고 비자연적인 건축들에 인공적인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행위가 ‘조경’이라면 그것을 촬영한 사진은 곧 자연을 통제하고 끌어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과 사회전체의 비도시적인 환원을 향한 ‘욕망’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언제나 자연을 조작하려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욕망 내에서만 가능하다. 조경활동은 인공적이기에 자연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실행불가능한 전략을 증명할뿐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는 ‘조경’활동에 대한 기대와 달리 ‘유리와’, ‘홍철기’ 두 작가의 사진 속 나무가 기이하게 촬영된 것도 그 안에 내포되있는 욕망 때문이다. 가로수의 과도한 성장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는 후속처치를 부른다. 잘리게 될 미래를 부르면서도 나무는 꿋꿋이 자랄 수 밖에 없다. ‘홍철기’ 작가는 그런 방향성 없는 몸부림을 통해서 ‘비어있는 생명’을 포착했고, ‘유리와’작가는 ‘필사적인 삶’의 형태들을 병렬시켰다.
조경사진(3), digital pigment print, 70x88cm, 2010
‘홍철기’ 작가는 나무를 통해 본인을 자각하고 동시에 그 비어버림, 방향성 소실의 모습을 나무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유리와’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나무와 연동시켜 그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두 작가의 시선은 얼핏 보면 다른 방향의 시선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두 시선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형태의 다른 면면이다. 두 작가 모두 도시안에 수렴된 조경물의 기이한 뒤틀림에 닿아있고, 그 욕망의 구체물에서 ‘생生’과 ‘공空 혹은 사死’가 뒤섞인 모습을 현상한다. 결국 나무 자체는 더 이상 그 본질을 가지지 않고 자연도, 도시도 아니다. 오로지 두 작가의 시선에서 비춰지는 것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여기서 나무는 ‘필사적인 삶’(유리와)을 살아도 결국엔 ‘비어버린 생명성’(홍철기)이 ‘죽음’을 확인시키는 일뿐이라는 회의주의자적인 결말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가진다. 하지만 두 시선은 서사적인 전개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구체화하면서 뒤섞이기 때문에 회의주의적이기 보다는 그 이미지 사이를 미끄러져 나가서 오히려 현실의 인식을 돕는 렌즈처럼 기능한다.
한국의 도심의 ‘조경’은 공원이나 거대한 건축적 사안들에 부합되는 것과 달리 하나의 절차같이 느껴진다. 당연히 부속품처럼 껴있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건축적인 맥락이 부재하는 조경물에서는 인간의 단순한 욕망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배치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인 ‘미’는 멀어진다. ‘홍철기’ 작가와 , ‘유리와’ 작가가 보여주는 조경물의 모습은 그렇게 '미'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당연히 지나치는 것을 ‘생경하게’ 만든다. 사진으로 찍은 풍경과 우리가 지나치며 마주하는 풍경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신의 시선을 통해서 그 동일한 외형적 부분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욕망의 풍경을 보여준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대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둘의 작업 또한 탁월한 감각으로 언캐니한 아름다움을 낚아낸다. 현대의 산수화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이 기이한 풍광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산수화다. 그것은 욕망의 알몸을 보여준다. 두 작가의 개인전이 다소 멀지 않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공개된 것도 흥미롭지만 그들의 작업을 보는 내 시선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동시에 다소 억측에 불과한 의견은 아닌지 우려 되기도 한다. 오늘도 나는 나무들을 지나치지만 그들의 사진 속 피사체 처럼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오로지 작가의 시선 안에서 그 의미들은 지속된다. ‘홍철기’와 ‘유리와’ 두 작가의 사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욕망의 각각 다른 구체물이다.
by. 하마
사진 출처
공통 : 직접 촬영
홍철기 작가 : 합정지구 페이스북
유리와 작가 : 사진위주 류가헌, 지금 여기 홈페이지, http://art.khan.kr/286
레고나무 : http://www.amazon.com/LEGO-Garden-Pack-Trees-Flowers/dp/B0041PGYT6
- 제목이 동일하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로 구별하도록 하겠다. 제목은 모두 <조경사진> 이며 실제 전시에서 배치는 상이하다. [본문으로]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동주 : 전야 Night before [Review] (0) | 2015.09.06 |
|---|---|
| [이미지 - 사이] Review (0) | 2015.09.02 |
| [정덕현 : 역사는 더 나쁘게 과거를 반복한다] Review (0) | 2015.08.23 |
| [엘름그린&드라그셋 : 천 개의 플라토 공항] Review (0) | 2015.08.09 |
| [김정은 oci 미술관 self; mapping] REVIEW (0) | 201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