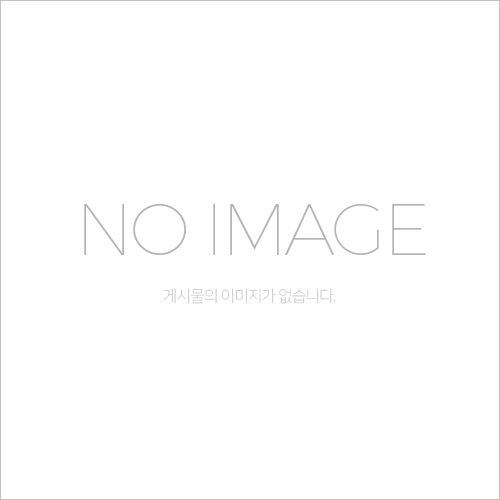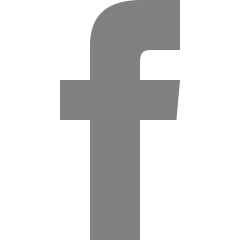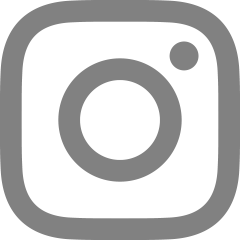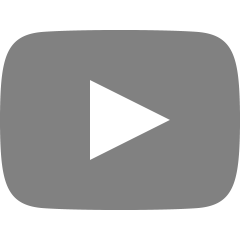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이미지 - 사이] Review
공간291
이미지-사이
2015. 8.5-9.5
무매개적으로 관계맺는 미술의 이미저리
2015년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도처에 만연한 이미지들에 둘러쌓여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과거와 달리 벌거벗은채 자기를 감추지도 않는다. 이미지는 반복/증식되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변별적으로 이미지의 도해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가상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세계는 점점 비-현실에서 지각되는 초월적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발전에 힘쓴다. 우리를 현혹하고 중독시키는 이미지들을 경계할지, 받아들일 것인지는 모호해보인다. ‘지금’의 판단기준에서 ‘미래’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할순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미지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이미지의 원천이었다가 그것을 배제시키는 근대적 전략을 실행해온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을 어떤식으로 바라보아야 할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하는것은 아닐까? 모더니즘의 전략 자체는 실패로 드러났지만 지금도 성공으로의 전회를 위한 ‘리모더니즘’전략은 판치고 있다. 그 전략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술에는 재현의 문제들이 다시 유입되었다. 오늘날 이미지는 재현체계에서 매개자가 아니라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공간 291에서 열린 <이미지-사이>전시는 작금의 ‘이미지’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을 통해 ‘예술’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좋은 기회다.
공간 291에 들어서면 ‘전지현’작가가 바닥에 깔아놓은 펠트천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마치 공사장이나 수리중인 곳의 바닥 풍경처럼 정신없게 바닥에 깔린 천들은 당최 이미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펠트천들은 건축적 공간을 상이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관계하면서 사물 자체의 ‘이미지’를 예술 안으로 당겨온다. 천들은 바닥에서 벽에 맞닿도록 깔려있다. 벽으로 빠져나온 천들은 바닥의 2차원 구조를 3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이때 우리의 시각에는 벽의 공간성이 대두되어 드러난다. 당연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건축적인 공간’을 체현하는 것이다. ‘입체공간’, ‘실존공간’의 감각적 매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펠트천은 기능하고 있다. 작가는 펠트천 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밟고 돌아다니며 공간을 탐닉하도록 유도한다.
전지현_Untitled, Dimensions variable, Felt, 2015
전지현_Untitled, Dimensions variable, Felt, 2015
전지현_Untitled, Dimensions variable, Felt, 2015
펠트천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있는 기하학적 무늬의 ‘테이프’를 볼 수 있다. 벽에 들러붙어 상이한 구획을 만들어내는 ‘테이프’는 펠트천과 마찬가지로 ‘공간성’의 논리를 확증시킨다. 중요한 것은 테이프가 어떤 형태로 붙어있는지를 보는게 아니라 ‘왜,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다. 테이프는 벽에서 꺾인 벽면쪽으로 삐져나와 붙어있다. 이 부분은 펠트천의 빠져나온 부분처럼 2차원으로 인지하는 것을 3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이 이미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다소 익숙하지만 전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건축적인 공간성’이라는 언어를 더하고, 보이는 것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도록 돕는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내가 딛고있고, 기대며, 들어와있는 촉각적인 언어로도 설명된다. 따라서 ‘전지현’작가의 이미지는 ‘육화’된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을 촉각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이 이미지들은 결국엔 공간안에 고립되기 마련이다.
전지현_Untitled, Dimensions variable, Tape, 2015
전지현_Untitled, Dimensions variable, Tape, 2015
전시장 지하로 내려가면 벽면에 걸린 작업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지현’ 작가가 현존하는 공간성을 지각하도록 돕는다면 ‘강소연’작가는 이미지 자체의 교활한 환영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직시적’으로 드러내기다. 공통적으로 그녀는 실제작업과 그것의 다른 가상배치도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작업으로 <Orange-Gray>은 주황색으로 칠해진 캔버스와 윗부분에만 회색을 과하게 덮은 캔버스 각각을 왼쪽부분에 배치하고, 오른쪽의 큰 캔버스에 ‘주황색’, ‘회색’이 칠해진 캔버스에 대응하는 위치에 각각 ‘셀로판지’를 붙이고 ‘투명한 판’을 껴넣은 모양이다. 가운데에는 주황색의 시선유도봉이 오른쪽 캔버스와 노란사슬로 연결되어있다.
강소연_<Orange-Crey>, window film, PET, Aclylic & Oil on Canvas,
107x111, 20x40, 45.5x53cm, 2013
강소연_<Orange-Crey>, window film, PET, Aclylic & Oil on Canvas
107x111, 20x40, 45.5x53cm, 2013_가상배치도
한눈에 들여다보기에 쉽지않은 이 작업의 포인트는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같은 배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회화의 평면성을 작가는 농락하고 있다. 왼쪽 편을 처음 봤을 때 두 캔버스는 추상회화를 전시장에 걸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는 아직 평면성이 유지되어보인다. 그러나 오른쪽의 큰 캔버스에 구성된 모양과 왼쪽 각각의 캔버스의 배치가 복사한 것 처럼 같은 배치임을 알게되면 왼쪽의 각각 캔버스는 갑자기 ‘평면’이 아니라 ‘부조’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오브제’로 전락한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보면 흰 캔버스에 ‘붙고’, ‘끼어져’ 평면이 되버린 옆편의 오브제들이 ‘평면성’을 유보시킨듯 보인다. 유보의 순간 중간의 시선유도봉이 끼어든다. 그 유도봉은 노란 사슬과 연결된 캔버스를 다시 오브제로 귀결시킨다.
강소연_Yellow lines, Digital painting, 2014
<Yellow lines Digital Painting>은 노란색의 색면만 있는 하단부와 입체적인 상단부가 나뉘어져 인쇄되어있다. 상단의 입체도에 하단부와 동일한 색으로 작가는 X를 그렸다. 이 X 알파벳은 가상적인 입체성이 거짓된 것임을 선고한다. <Orange-Gray>가 평면성의 반복적인 좌절을 통해 ‘회화’의 과거전략을 조롱한다면 이 작업은 현대의 가상적 입체감을 ‘평면성’을 통해 비판한다. ‘강소연’작가의 작업들은 시각에 매개되는 이미지의 조작을 의도적으로 해체해서 보이는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전략또한 조작적인 제스처로 나타난다.
‘류현민’작가는 실제 사물과 이미지의 관계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은 미술계에서 이미지를 미술로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의문점이다. 그녀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다양한 색의 ‘못’이다. 이 못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쇠·대·나무 따위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든 물건.’이라는 원래 못의 정의도 무색해진다. 그것은 오로지 못의 본질을 제거한 색의 인쇄물이자 이미지 그 자체다. 그런데 나열된 작품의 끝부분에서 갑자기 한쪽만 걸린 작업이 나타난다. ‘주황색 못의 이미지’의 인쇄물이 담긴 액자를 지탱했어야 할 ‘못’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박힌 못은 우리가 이미지로 보았던 그 못의 실제다. 여기서 한낱 사물인 못이 미술의 영역에서 ‘작품’으로 선택되고 ‘전시’까지 할 수 있는 당위성이 드러난다. 작가는 사물이 예술이 되는 제도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실상 이전의 그런 전략들은 ‘반미술’, ‘반예술’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 와서는 한낱 아방가르드 제스처로 전락해버리는 운명적 종결을 맞이해버렸다.) 동시에 본인의 작업도 제도에 의해서 전시된다는 사실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이것이 가능한것은 이미지가 비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관계조율’의 논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제도의 당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고발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관계적인 맥락에서 드러나게끔 한다. 작가가 ‘이미지’라는 언어체계와 ‘사물’의 관계롤 통해 지적하려하는 ‘제도’의 문제는 시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획득된다.
류현민, Untitled, 33x50cm, pigment print, 2015 (blue)
류현민, Untitled, 33x50cm, pigment print, 2015 (red)
류현민, Untitled, 33x50cm, pigment print, 2015 (orange)
류현민, Untitled, 33x50cm, pigment print, 2015 (Orange)_Installation View
우리는 이 전시에서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조작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공간내의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논리를 신체적으로 체험하고(전지현), 평면을 다시 평면에 흡수시키는 거짓 동작의 반복 과 가상의 입체적 환영에 대한 고발을 통해 평면적 이미지와 입체적 이미지가 현실과 가상의 모든 영역에서 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게 한다.(강소연), 마지막으로 실제사물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이미지의 특징을 통해서 오브제가 미술로 명시되는 제도적 관계를 시각화하고, 그것을 다시 기능적 사물로 환원하는 것을 ‘전시장에 거는 것’을 통해 실현하는 전략을 보았다.(류현민) ‘정운’작가의 작업은 제대로 전시되있지 않아서 살펴보지 못했고 글에다 담을 수 없어서 참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이 전시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미지’ 자체를 모두 대표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지와 다른 것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랑시에르’가 ‘이미지의 운명’에서 “이미지의 가장 일반적 체제는 말할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사이의 ‘관계’, 둘 사이의 유비와 비-유사성 모두에 기초해 작용하는 관계를 연출하는 체제”라고 설명할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작가들의 감각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름답지는 않아도 시각적으로 즐겁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이미지와 ‘어떤 것’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자신을 ‘감추는 것이 있는 듯’ 위장하는 이미지는 동시대에 여전히 산재한다. 동시대의 이미지는 과거부터 지금 까지의 모든 이미지가 지층처럼 켜켜히 쌓여서 모두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지층은 유동적이여서 2015년에도 20세기 혹은 중세시대의 신석기 시대의 이미지들을 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술에서의 이미지란 것은 관계설정, 기호의 조작놀이로서 설명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지-사이>전시에서 무엇을 발견해야할까? 이 전시는 이미지들의 병렬적 ‘틈’에서 모든 의미가 미끄러지고, 이미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율’하는 것을 통해 ‘예술’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교활한 이미지들을 경계하고 변별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르는게 이미지를 통해 ‘가상, 현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짓뭉개고 뒤섞는 ‘지금’ 필요해보인다.
by. 하마
사진 출처 : 직접 촬영 및 전시 책자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청각-Move&Scale] Review (0) | 2015.10.19 |
|---|---|
| 강동주 : 전야 Night before [Review] (0) | 2015.09.06 |
| 홍철기_맹지/유리와_조경사진 [Review] (0) | 2015.08.26 |
| [정덕현 : 역사는 더 나쁘게 과거를 반복한다] Review (0) | 2015.08.23 |
| [엘름그린&드라그셋 : 천 개의 플라토 공항] Review (0) |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