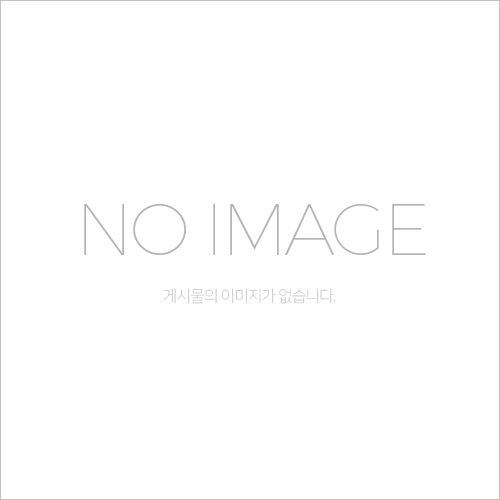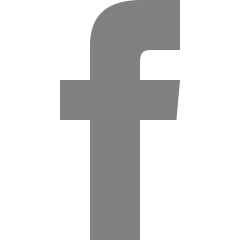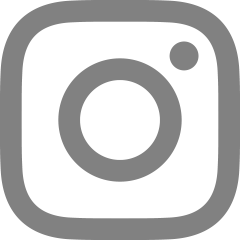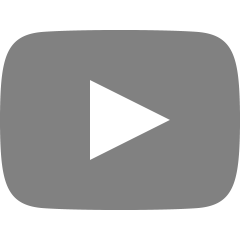강동주 : 전야 Night before [Review]
강동주
두산갤러리
전야 - Night before
2015. 9.2 - 10.3
현실의 극치 - 네거티브 이미지
회화의 영역에서 재현의 ‘방법’(어떻게?)은 더 이상 일 순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상’(무엇?)을 재현하는 ‘이유와 태도’(왜?)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다. ‘대상’과 ‘이유’ ‘태도’ ‘방법’ 중 무엇 하나가 삐걱거리면 의미 없는 ‘죽은 그림’으로 보이기 쉽다. 따라서 동시대의 회화 작가들은 공통으로 하나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회화’란 무엇인가? ‘재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답 없는 질문은 작가들의 다양한 양태로 서술된다. 젊은 작가 중 ‘강동주’ 작가의 작업 또한 회화본질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작가 본인만의 특징적인 네거티브 이미지를 추출한다.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전야’에서 공개된 작업들에서 반전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들, 모호한 그 형태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나는 궁금했다.
전시 전경
‘강동주’ 작가는 2012년 첫 개인전 ‘정전’ 이후 먹지와 종이, 연필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치거나 존재하는 곳의 ‘빛’과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2013년 OCI 미술관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 ‘부도심’에서 공개한 일련의 작업들(<빛 드로잉>, <달 드로잉>, <하늘회화>)처럼 이동시 경로의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보여준다. ‘부도심’ 전시에서 정해진 경로를 토대로 한 것과 달리 이번 전시는 출발지(집)와 도착지(집)만 정해진 경로 없는 행적을 보여준다.
날짜 |
시간 |
멈춘 횟수 |
2014년 3월 |
55분 43초 |
18번 |
2014년 5월 |
1시간 30분 35초 |
36번 |
2015년 1월 |
1시간 58분 3초 |
38번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무작위로 선택된 세 번의 날에 작가는 길을 정하지 않고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향했다. 그래서 각각 선택된 날에 이동에 걸린 시간은 제각각이다. 작가는 100걸음 마다 멈춰 섰다. 그 ‘멈춘 순간’이 이번 전시 작업들의 이미지를 포착한 ‘순간’이기도 하다. 전시장에서 들어서면 ‘부도심’ 때부터 이어오는 <빛드로잉>인 두 작업[<밤의 이면들> 시리즈와 전시이름과 같은 <전야> 시리즈]에 집중하게 된다. 전시장 입구에서 오른쪽을 쳐다보고 전시를 감상하기 시작하면 ‘2015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를 역순으로 감상할 수 있다. 먹지에 각각 그려진 38, 36, 18장의 그림은 작가가 이동하면서 멈춘 순간의 ‘빛’의 궤적을 그린 것이다. 먹지라는 매개체에 묘사된 ‘빛’은 그 원래 속성처럼 ‘밝아진다.’ 밤의 시간에 빛의 궤적을 쫓고 그것을 포착하는 행위는 낮에 만연한 이미지들을 피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담아내는 것이다. 먹지에서 탈색된 부분은 희미하게 보이며 비슷한 형상들이 반복된다. 전시장의 벽면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먹지는 ‘밤에 비추는 빛’을 전시장 내에 전사시킨다.
1시간 58분 3초 밤의 단면들(2015.1), 2015 먹지, 90x61cm (각38조각)
1시간 58분 3초 밤의 단면들(2015.1), 2015 먹지, 90x61cm (각38조각) 중 부분
1시간 30분 35초 밤의 단면들(2014.5) 2015, 먹지, 90x61cm(각 36조각)
1시간 30분 35초 밤의 단면들(2014.5) 2015, 먹지, 90x61cm(각 36조각) 중 부분
55분 43초 밤의 단면들(2014.3), 2015, 먹지, 90x61cm (각 18조각)
55분 43초 밤의 단면들(2014.3), 2015, 먹지, 90x61cm (각 18조각) 중 부부
<전야> 작업은 <밤의 단면들>을 그릴 때 먹지에서 종이로 칠해진 것으로 [38, 36, 18] 번의 멈춤이 한 이미지로 압착되어있다. <밤의 단면들>에서 뺏어낸 그 검은색은 합쳐져서 하얀 종이 위에 ‘빛’을 네거티브 이미지로 그려낸다. 이 지점에서 <밤의 단면들>과 <전야> 작업은 서로의 반전-이미지가 된다. <전야>의 이미지는 <밤의 단면들>에서 모호하게 보이는 빛을 오히려 ‘검은색’으로 채워 확실하게 만든다. 두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포착한 밤의 도시 풍경은 반복, 연쇄적으로 그려진다. 작가의 이미지에서 형태보다 행위가 중요한 것은 재현된 ‘빛’의 도상이 걷는다는 동시에 본다는 것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1시간 58분 3초(2015.1) 전야, 2015 종이에 먹지, 350x150cm
1시간 30분 35초(2014.5) 전야, 2015, 종이에 먹지, 350x150cm
55분 43초(2014.3) 전야, 2015, 종이에 먹지,350x150cm
작가는 먹지를 선택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며 “드로잉 할 때, 내가 그리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먹지를 선택했다. 그릴 때는 빛을 까맣게 그리는데, 받아들이는 먹지는 그것을 하얗게 받아들인다. 어쩌면 나는 빛을 어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둠은 먹지 위에서 다시 빛이 된다. 그래서 먹지를 선택했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처음에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린다. 그 과정에 종이 밑에 깔린 먹지가 개입된다. <밤의 단면들>은 이렇게 그려진다. 먹지는 위의 종이에 그어지는 대로 자기의 색을 배태한다. 다음에는 먹지 밑의 종이가 배태된 색을 받아들인다. 첫 그림의 형태와 먹지의 색을 합한 <전야>는 반전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빛과 그림자가 도치된 풍경이다. 작가가 빛을 어둠으로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만든다고 한 것처럼 먹지 위에서는 어둠이 빛이 되지만 그 끝의 종이에서 빛과 어둠은 혼용된다. 표면으로 반전된 형상을 꺼내면서 일련의 과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빛 드로잉>에서 작가는 빛의 궤적을 쫓음으로 ‘어둠’을 재현해낼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의 작업 중에서는 ‘땅 드로잉’ 시리즈를 흥미롭게 보았다. 처음 작업을 마주하면 작가가 멈출 때마다 바닥의 표면을 ‘프로타주’ 한 작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작업은 먼저 바닥 표면을 종이 위에 연필로 프로타주 하지 않고 표면의 굴곡만 새기는 데서 출발한다. 본래 프로타주한 형상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색을 받아들이고, 들어간 부분이 여백이 되는 것과 달리 작가는 새겨진 형상에서 그 관계를 반전시킨다. 이 네거티브 된 바닥표면은 <밤의 단면들>과 <전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거티브 이미지’의 특성을 답습한다.
1시간 58분 3초 밤의 땅(2015.1), 2015 종이에 연필,23.5x16.5cm (각38조각)
1시간 58분 3초의 땅(2015.1) 2015 종이에 연필 23.5x16.5cm
1시간 30분 35초 밤의 땅(2014.5) 2014, 종이에 연필, 23.5x16.5cm (각 36조각)
1시간 30분 35초의 땅(2014.3) 2014 종이에 연필 23.5x16.5cm
55분 43초의 땅(2014.3), 2014, 종이에 연필, 23.5x16.5cm (각 18조각)
55분 43초의 땅(2014.3) 2014 종이에 연필 23.5x16.5cm
‘땅 드로잉’에 재현된 형상은 얼핏 ‘우주의 별빛’ 같다. 이것은 우연일까? ‘부도심’ 전시에서 공개했던 <하늘회화> 시리즈가 하늘의 ‘표상’을 담아냈다면 우연히도 ‘땅 드로잉’ 시리즈는 땅의 표면을 취하고 그것을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밤하늘’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얻어낸 것이다. 전시설치에서도 수직적인 구도를 취하게 되어있어 작업의 효과는 증대된다. 작가의 발디딤의 증거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로서 ‘땅 드로잉’은 작동한다. <땅 드로잉>과 <밤의 단면들>은 서로 마주 보게 전시되었다. 서로는 각자가 부족한 지점을 보완한다. <땅 드로잉>은 전체공간의 풍경/수평적 시야를 제공 받고, <밤의 단면들>은 작가의 발자취에 대한 증거/수직적 시야를 제공 받는다.
전시 전경
<1/0-on, then off> 작업은 전시장을 따라 관람하던 중에 ‘종이’나 ‘먹지’가 아닌 ‘벽’에 그려진 드로잉이다. 여기 그려진 도상은 우리가 <전야> 작업에서 본 반전된 빛의 형태이다. 작가의 행적을 떠올리게 하는 이 도상은 전시장의 벽면에 새겨지면서 전시공간과 작업의 ‘물리적’, ‘시/공간적’ 차이를 좁힌다. 이렇게 전시장 내에서 작가의 행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은 <시보> 시리즈가 이어받는다. 이 작업에는 검은 원과, 하얀 원, 그리고 선이 그려져 있다. 각각의 날짜와 시간 멈춘 횟수에 맞게 선의 중간에 검은 점이 그려진다. 그렇다. 검은 점이 바로 작가가 멈춘 순간을 상징한다. 다른 작업이 그려진 순간이 어떤 ‘궤적’ 속에 있었는지 상상하게 하는 이 작업은 <1/0-on, then off>와 함께 ‘안내도’, ‘약도’처럼 기능한다. 두 작업은 작가의 물리적 걸음과 그에 따라 재현된 <빛 드로잉>, <땅 드로잉>의 모호한 형태들을 ‘현실적인’ 이미지로 기능하도록 안내한다.
1/0-on, then off(2015년 1월), 2015, 벽에 먹지, 가변크기
시보1,2,3
시보 3(2015.1) 2015, 종이에 먹지, 48.7x33.4cm
시보 2(2014.5) 2015, 종이에 먹지, 48.7x33.4cm
시보1 (2014.3),2015, 종이에 먹지, 48.7x33.4cm
‘강동주’ 작가의 이미지들은 현실적 구상형태를 재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낮엔 장소가 이미지로 다가오고, 그래서 재현에 치우치게 되는데, 적어도 시야가 옅어지는 밤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장소의 만연한 이미지가 밤의 어둠에 덮여있을 때 즉, 그 시야가 옅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재현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낮의 이미지 재현을 피한 결과는 얼핏 이미지의 제거를 꿈꾼 모더니즘 추상회화처럼 느껴진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미지로 귀결되었지만, 형상만큼 모호할 수 있는 작가 본인의 기억을 확증시키는 반복, 연쇄 전략에 따른 흑백드로잉들은 재현 방법이 ‘왜’ 재현하는 가라는 질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강동주’ 작가의 작업은 그 자체로 육화된 표현이 된다. ‘강동주’ 작가의 드로잉들은 ‘리얼리즘’의 극치다. 밤의 재현은 다소 마술적 환상의 이미지로 보이지만 그 ‘디세뇨’부터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식론적인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보는 이에게 마저 ‘현실적’ 감각을 요구한다. 시각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그 ‘밤의 이미지’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사진 출처 : 직접 촬영 및 두산 갤러리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윤삼 - 국민 [Review] (0) | 2015.12.02 |
|---|---|
| [시청각-Move&Scale] Review (0) | 2015.10.19 |
| [이미지 - 사이] Review (0) | 2015.09.02 |
| 홍철기_맹지/유리와_조경사진 [Review] (0) | 2015.08.26 |
| [정덕현 : 역사는 더 나쁘게 과거를 반복한다] Review (0) | 2015.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