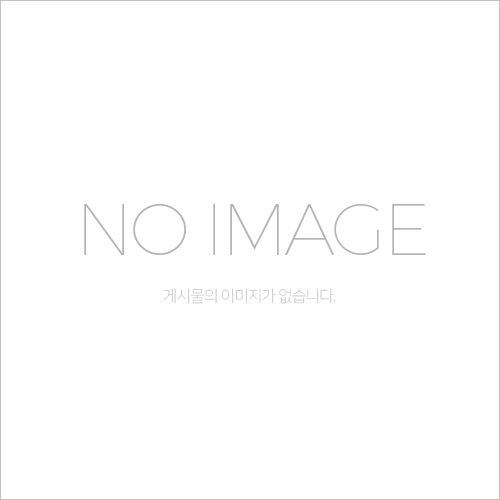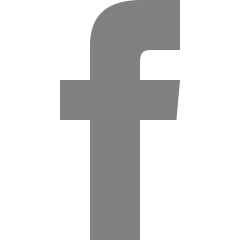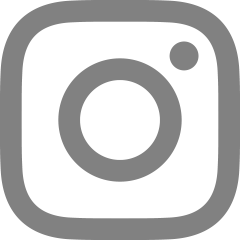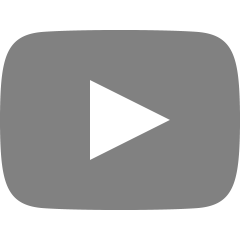강동호-Nevermore-뭉뚱그린 혹은 뭉개진 것들
강동호 - Nevermore
뭉뚱그린 혹은 뭉개진 것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그려내는가? 비단 회화라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채 어떤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수단은 넘쳐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화는 가장 원초적인 ‘원작’의 생산 수단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미학, 예술 이론에 의해 원작성이란 의심받아 마땅한 개념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건 마치 책과 학술대회에서만 가능한 개념처럼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되는 장은 불법적인 것과 더 연관되기 쉽다. 오늘날 우리는 원작성이 ‘저작권’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탈바꿈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충돌의 시대에 회화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회화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수없이 많은 기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혹 한 작가의 전략에서도 직접 드러나기도 한다. 위켄드와 2/W에서 진행된 ‘강동호’의 개인전 ‘Nevermore’도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어떤 형태를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와 내부를 상정한다. 비단 이것은 시 지각적 감각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가족 같은 물리적 집단으로 구성된 ‘추상적 개념’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가 필요하다. 이 경계 짓기의 최종심급에서 우리는 자아를 유추하곤 한다. 그러나 항상 이런 구분이 옳다고 말할 순 없다. 오늘날의 이미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곽선’에 친화적이다. 그 이유는 명백한데, 바로 프로그램의 벡터값으로부터 구현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벡터값에서부터 구현되는 어떤 이미지는 결국 수학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경계’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지에서 그런 경계들을 형태, 색, 외곽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강동호의 회화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그는 그림에 각각의 요소를 섞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전시에 출품된 작업 이미지들의 연관 관계는 불투명해진다. 요소가 섞인 기준도 하나의 작업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관람자에게 작품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섬처럼 보이게 한다. 이 섬 각각을 연결하는 최소한의 고리는 바로 ‘뭉개짐’이다. 이 전시의 회화에서는 색이 뭉개지기도 하고, 형태가 뭉그러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외곽선까지 소실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일종의 ‘알고리즘’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든다. 도대체 이 전시의 그림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려져 있는가?
<Suit> 작업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색을 통해 관람자는 하늘을 지각할 수 있다. 그다음 형태에 의해 ‘윙 슈트’라고 부르는 옷을 입고 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에 삐져나온 이빨과 같은 형상을 마주친다. 하나의 화면에서 이 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눈은 이미지를 지각한다. 강동호의 회화 작업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는 앞에서도 말했듯 뭉개짐이다. 다시 두 사람을 보자. 우측의 사람은 더 정확하게 묘사된 반면 좌측 인물의 왼손은 다른 차원으로 사라진 듯 보인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 안의 이목구비가 뚜렷해보이지만 흐릿하다. 이런 형태들은 마치 데이터의 전송이 늦어져 화면에 불투명하게 전사된 이미지처럼 보인다. 따라서 과연 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인지 관람자는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더더욱 좌측 상단에 튀어나온 형상들은 시각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Chilly Pepper>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작업인 동시에 잔혹하게 보였다. 이 작업에서 가장 먼저 연상된 것은 계란 노른자, 흰자 그리고 양념 통닭 네 마리다. 나에게 이 그림은 일견 닭이라는 생물이 처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은유로 보였다. 하지만 잠시 그림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이 돌아왔을 때 이미지의 의미를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봤을 때 그림은 혈액이 가득차있는 모습같기도 했고, 불이 지펴지는 과정같기도 했다. 외곽선과 형상이 경계에 맞춰 형태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관람자는 무엇을 재현한지 알 수 없다. 동시에 형상과 배경의 색온도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뭉개짐은 한 층 강화된다. 강동호의 회화에서 보는 이는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상징적 형상’들을 자주 마주한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비상징적 형상’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의미화 과정은 지속해서 미끄러진다.
<Nevermore>, 2019, oil on canvas, 162.2x97.0 cm.
<Nevermore>는 이 전시의 제목과 동일한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다른 곳에서 외곽선 붕괴를 의도적으로 과시하듯 보여준 ‘검은색’의 사용이 사치스러울 정도다. 검은색 배경은 이미지 속 상황을 밤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토끼를 어둠이 잠식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님을 알게 된다. 전반적으로 강동호의 회화 속에서 배경과 그림 속 대상이라는 구분은 망실된다. 검은색 배경은 그림의 하나의 요소로서 분명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그림 안에서 조명되어야 할 중심 대상을 비추기 위해서 뒤로 물러난다. 강동호는 그런 모든 요소를 하나로 뭉개버린다. <Wheeling>과 <Breast-side Up> 같은 작업에서도 여전히 이런 뭉개짐이 이어진다.
<Breast-side Up>, 2018, oil on canvas, 90.0x72.7cm
강동호의 작업이 일련의 뭉개짐을 통한 회화 각 요소의 통합을 꾀하는 전략이라면 앞에서 묘사한 그림의 경우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강동호 작가는 본인의 전략을 기준으로 삼아 모호한 상황을 회화에 부여함으로써 구상과 추상에도 머물지 못한 채 계속 미끄러지는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Pepper>나 <Meeting>과 같은 작업들은 그런 전략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Pepper>의 경우 사람인 듯 로봇 같은 회화 속 인물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데 거기서 그치고 만다. <Meeting>에서는 형상이 휘어져 있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다른 회화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이상을 발견할 순 없었다. <Meeting> 작업에서는 <Chilly Pepper>와 <Suit>의 특징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 작업에서도 여전히 배경과 주 대상의 색은 유사하다. 또한 우측 상단에서 잘려버린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요소가 섞였는데도 <Meeting>에서는 강동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 전략적 실패는 바로 중앙의 건물 형태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건물의 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 속에서 뭉개짐이라는 공통 요소는 불분명하다.
<Meeting>, 2018, oil on canvas, 53.0x45.5cm
<Pepper>, 2017, oil on canvas, 45.5x37.9cm
한 작가가 개인전에서 자기 장르의 향방을 묻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나 강동호 작가는 전략적 승부수로 이 질문들을 성공적으로 던지고 있다. 몇 작업에서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질문과 대답들을 나머지 작업에서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좋은 작업은 자신이 표상하는 전략을 형상뿐만 아니라 전체 상황 속에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강동호 작가의 전략은 오히려 각 작업간의 형상적 연쇄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형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도 역시 연속적으로 붕괴되고, 그 이후에 관람객들은 각 그림이 왜 이 전시장에 나열되어있는지 묻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이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그려내는가?
사진 출처 : 직접 촬영
by Hipohipomen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운 지구 정치를 위한 인식법- Painting과 Scanning 사이에서 (0) | 2021.08.21 |
|---|---|
| [Review] 갤러리현대-김성윤-Arrangement (0) | 2019.08.19 |
| 이나하 RESIZE - 줄이고 줄이다 보면 보이는...(것) (1) | 2018.07.07 |
| 금호 미술관 - 플랫랜드 / 스치는 감상평 (0) | 2018.06.13 |
| 원앤제이+ / 윤향로 - Screenshot [Review] (0) | 2017.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