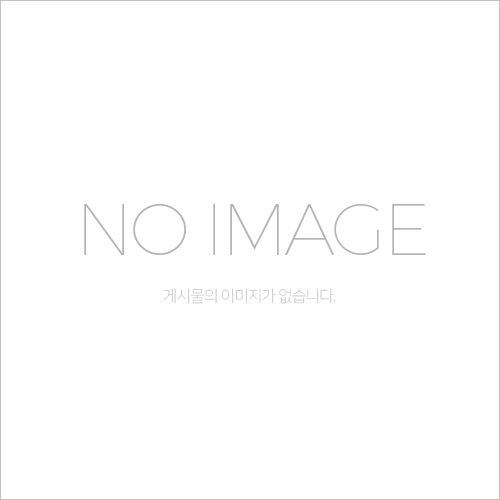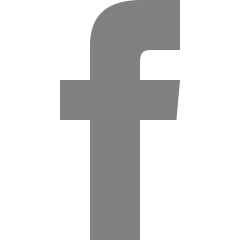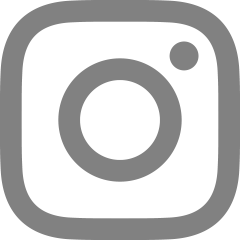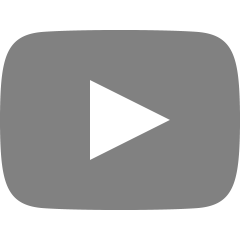금호 미술관 - 플랫랜드 / 스치는 감상평
금호미술관
Flat Land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이 세계를 2차원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그 활동을 우리는 단순히 압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3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할때 치명적인 정보손실이 일어난다. 그 정보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현존'한다는 감각이다. 그러나 이렇게 압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컴퓨터 데이터 속 평평한 이미지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자체를 우리의 심상에 '이미지'화 함으로써 언제나 3차원을 2차원으로 아로새겼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추상'의 속성 중 하나를 '평평함'으로 따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무수한 모노크롬 회화들이 주장한 '침묵'과 '수련'과 같은 행위(반)지향적 주제가 추상회화에 담길 수 있었던게 아닐까? 어쨌든 이 전시는 그 평평함이라는 추상의 속성을 도시와 연결짓고자 한다. 그런데 도시라니? 도시와 추상, 추상과 평평함, 평평함과 도시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단 말인가?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최선'의 작업을 볼 수 있다. 최선의 작업은 흥미롭게도 다양한 세계의 삶의 모습들을 평평한 이미지로 재매개한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숨'을 이용한다. 숨이란 가장 극명한 삶의 증명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시장 벽면 저네를 메꾸는 누군가들의 숨은 압도적인 생명력을 자랑한다. 또한 이렇게 불어넣어진 물감은 에어브러시를 연상케한다. 에어브러시는 칠한 티가 나지 않게끔 색을 대상 위에 입힌다. 그것은 극도로 통제된 기계의 숨이다. 사람의 숨은 그 꿈틀거리는 생만큼이나 캔버스 위를 생생히 가로지르며 나타난다.
지하로 내려가면 '차승언'의 작업을 볼 수 있다. 그는 캔버스 자체를 평면이미지의 기초로 삼아 직조한다. 다양한 색의 실로 직조된 캔버스는 일견 색면추상처럼 보인다. 그의 전략 중 하나는 그렇게 직조한 캔버스 위에 다시 물감을 칠하는 것이다. 실로 전유한 회화의 문법을 다시금 회화의 재료로 덧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작업한 것이 작업이기 이전에 캔버스라는 지지체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러고 보면 그려진 회화 이미지는 지지체 위에 입력된 정보일뿐이다. 전시장에 유독 평평함이 아닌 물질감을 자랑하는 작업은 등산복의 실을 해체해 다시 만든 것이다. 물질을 평평한 것으로 다시 만드는 전략은 이 전시 전체에 감도는 분위기다.
김진희는 물질을 분해해서 펼쳐낸다. 전시장에는 MP3를 분해해서 거미줄 처럼 펼쳐놨다. 우리는 이게 원래 무슨기능을 하던것인지 알아볼 수 없다. 하지만 펼쳐지는 물질은 각각 부품을 보여주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추상적 평면성이라는 개념자체가 비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점검한다.
박미나는 색들을 펼쳐보인다. 색 자체는 색면회화, 모노크롬 회화, 단색화가 가지는 무수한 의미의 늪의 물질적 토대다. 박미나가 펼쳐보이는 색들은 상업적으로 선택된 색이다.
조재영은 이 전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시'를 연상케 한다. 구획화된 도시 속 건물처럼 '유닛'으로 이루어진 그의 형상물은 하나하나가 분리되고 떼어질 수 있으며 교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은 이 전시에서 '유토피아'라는 작업을 선보인다. 간단한 내러티브가 섞인 이 작업은 전시전체에서 감도는 긴장감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평평함이 추상의 속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3차원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2차원을 생산하고 소비할 뿐이다. 우리는 2차원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김용익이 '유토피아'에서 선정한 빨간 땡땡이는 2차원의 생명을 대변한다. 땡땡이는 옮겨다니며 이상적으로 물질화(3차원화)하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된다. 빗나가고 빗나가다 마지막에 땡땡이는 2차원 속에서 이상적 모습을 허상으로 만들어내고 사라진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먼저 2차원의 이미지 자체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미지임에도 마치 현실처럼 위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땡땡이가 이상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던 현실의 캔버스는 전시장에서 높은 곳에 걸려있다. 작가는 이를 '유토피아'라고 상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원의 땡땡이의 유토피아다. 우리가 2차원 세계를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유와 같을까? 둘다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닿기 위해 발악한다. 우리는 2차원의 이미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글을 쓴다. 평평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다. 추상은 멀어지는 것이다. 물물교환에서 동전으로, 동전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카드로 이행하는 가치교환의 체계는 점점 추상화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 구조로 추상화된다.
사실 이 전시에서 '도시'라는 테마는 소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 자체가 평평함을 일부분 계승하지만 이 전시의 맥락과는 알맞지 않는다. 중요한건 도시의 평평함인데 도시는 실제 도시의 모습 자체가 중요한게 아닌 지도와 도시계획을 모방하고자한다. 그래서 보드리야르가 "지도가 영토에 선행"한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도시와 평평함은 다른 방식으로 할 말이 많다. GPS라던지.... 구글맵이라던지.... 뭔가 허무하게 소비된 '도시'라는 테마는 무의미하다.
결국 '플랫 랜드'에서 나는 3차원과 2차원의 간극을 느끼게된다. 이미지를 추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3차원 이미지라는 것은 없다. 언제나 이미지는 2차원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본다해도 그것은 이미지화될때 2차원의 세계로 진입한다. 특히나 우리의 기억이 '저장'에 의존할때 모든 세계는 2차원이다.
'TXT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동호-Nevermore-뭉뚱그린 혹은 뭉개진 것들 (4) | 2019.02.12 |
|---|---|
| 이나하 RESIZE - 줄이고 줄이다 보면 보이는...(것) (1) | 2018.07.07 |
| 원앤제이+ / 윤향로 - Screenshot [Review] (0) | 2017.08.20 |
| 두산 갤러리 / 강정석 - GAME1 [Review] (2) | 2017.02.16 |
| 변상환 -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 '서늘한 평화, 차분한 상륙' [Review] (2) | 2016.09.27 |